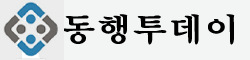해망굴은 깨끗하고 환해졌다. 바깥 축대도, 안쪽 천정과 바닥도 말끔하게 단장돼 있다. 그리고 여느 조그만 터널과 다름이 없어졌다. 좋은 일이지만 섭섭한 변화다. 1926년 개통된 연륜은 안내문이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오랜 골목을 부서버리고 고층 빌딩을 짓는 게 무조건 나쁜 짓은 아니다. 그렇지만 돈과 편리의 논리로만 헤아릴 수 없는 가치도 있다. 해망굴은 옛적 모습을 지우지 않고 가다듬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혜가 아쉽다.
오래 전 군산을 처음 간 날 그냥 걷다 해망굴을 만났다.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무작정 항구 횟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혼밥을 마치고 항구 쪽에서 거리를 걷다가 굴같은 것을 발견했다. 사람도 다지니 않고 구름 낀 날씨에 어두컴컴했다. 마침 할머니 한 분이 굴속으로 들어가던 참에 얼른 따라갔다.
발길이 굴의 끝에 이르자 갑자기 환한 빛이 쏟아졌다. 터널 끝에서 옹기종기 동네의 모습이 펼쳐졌다.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놀고 있었다. 교문 앞 문방구를 봤을 때는 어릴 적 막연한 그리움 탓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아담한 집들이 늘어서 있는 해망굴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다.
해망굴은 부둣가 쪽에서 시내로 걸어가는 게 좋다. 하지만 첫사랑의 연인을 보지 말아야 하듯 해망굴도 가슴에만 담아 놓아야 할 지 모른다. 기억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색깔을 달리할 때가 있다. 사람이 몰리면 돈이 흘러 오고 북적거리지만, 정적은 사라지고 더는 갈 수 없게 되기도 한다.
다른 언어로 시를 읽는다는 건 모험이다. 시를 읽는 자체가 난해하다. 생략과 은유의 절정에서 꽁꽁 숨겨 던져지는 언어와 정서를 받아내야 한다. 어떻게 얼마나 받을 지는 선택이지만 시를 읽는 한 피할 수 없다. 더구나 외국어로 쓰인 시를 번역한 것을 읽고 이런 도전장에 응해야 한다는 게 만만치 않다.
영화 ‘군산: 거위를 노래하다’에서 군산을 여행하는 윤영과 송현이 윤동주 시인을 놓고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윤동주와 군산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 공통 분모를 찾으라면 일본 제국주의일 것이다.
군산은 일제가 한반도에서 자행한 수탈의 상징같은 곳이다. 해망굴 역시 이기적 편리를 위해 뚫어 놓은 것이다. 후쿠오카 감옥에서 스물일곱 새파란 나이에 옥사한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수난의 증인이다. 그의 죽음은 하얀 광목에 뿌려진 빨강 꽃무리 같다. 세월이 흘러도 색이 바래기는커녕 더욱 선연해진다.
이바라키 노리코 시인은 생전 윤동주의 시를 만나면서 그와 연을 이었다. 그녀는 ‘내가 가장 이뻤을 때’라는 시를 발표해 전후 일본 문단을 흔들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대단한 미인이었다. 언뜻 문학 소녀의 서정시처럼 들리는 제목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가장 이뻤던’ 청춘을 군국주의자들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에 빼앗긴 억울함과 분함이 담겼다.
일본에서 대표적인 시인으로 성장한 나이 쉰 살에 이바라키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 윤동주의 시를 일본어로 번역했다. 일부 일본 교과서에 윤동주의 시가 실리게 된 데는 그녀의 역할이 컸다. 윤동주의 시를 맞닥뜨리며 시작된 그녀의 모험은 예상 못한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
'대사전을 베개 삼아 선잠을 자고 있노라면/ "왜 이리도 늦게 들어왔느냐" 하며/ 윤동주가 부드럽게 꾸짖는다.' 이바라키의 글 가운데 하나다. 윤동주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이바라키는 윤동주와 ‘동거’했다. 윤동주를 향한 그녀의 정성은 대단했다. 두 사람을 ‘연인’으로 묘사하는 글이 나올 정도였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읍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져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는 1941년 5월31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다. 연희전문에 다니던 시절 신앙적 방황을 겪은 뒤 마음을 추수렸던 참이었다. 그리고 내면에 정리된 세계관의 기준을 또렷하게 고백했다. 4년 뒤 윤동주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허락된 십자가'에서 '조용히 피를 흘리며' 천국을 향했다.
진정한 삶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의미를 던지고 화해의 나무를 키운다. 한번 뿐인 이땅의 삶을 의미없이 껍데기처럼 살다 갈 수는 없는 일이다. 하루를 어찌 흘려보냈는지도 모르고 어둠 속을 헤매다 눈을 감을 수는 없다. 깜깜한 터널에도 언제나 빛이 기다리는 끝이 있다. 빛 가운데 살고 볼 일이다. 눈앞이 환해지고 등이 따뜻해진다. 목덜미와 어깨에 뭉친 힘이 비로소 풀어진다. 해망굴 앞에 쏟아지던 햇빛이 그랬다. 빛은 오늘도 나를 기다린다.
Comment 0
| No. | Subject | Date | Views |
|---|---|---|---|
| 28 |
코로나가 '박수근 빨래터'로 내몰다
| 2020.06.04 | 3451 |
| 27 |
토론토의 교훈 "쉽게 돌아서지 말라"
| 2020.02.27 | 2756 |
| 26 |
부산 검도 후계자, 피지軍 장교, 미군 교관...그가 일군 빛나는 인생 여정
| 2019.07.03 | 1513 |
| » |
군산 터널 끝에서 만나는 윤동주
| 2019.06.14 | 18098 |
| 24 |
'추락하는 인생' 해장국에게 배운다
[2] | 2019.03.20 | 1593 |
| 23 |
비밀의 씨앗 ‘게이쿄’ & 도쿄 '다방'
| 2018.10.30 | 13087 |
| 22 |
비 속의 파리, 시애틀, 한밤중 시나이 반도 그리고 다시 서울
| 2018.05.30 | 1013 |
| 21 |
LA 장례식, 부여 야학당
| 2018.05.14 | 1044 |
| 20 |
인생의 지혜 물으니 "그때 꾹 참고 넘기길 잘했다"
| 2018.05.14 | 853 |
| 19 |
돈은 없고...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2018.05.14 | 848 |
| 18 |
잃어버린 나의 등대를 찾아서...
| 2018.05.14 | 1253 |
| 17 |
포기해야 할 순간들...그래야 산다
| 2018.05.14 | 964 |
| 16 |
오! 솔레미요~~샌타바바라
| 2018.05.14 | 686 |
| 15 |
이별은 끝이 아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 2018.05.12 | 1006 |
| 14 |
샌타바바라의 젊은 영혼들
| 2018.05.12 | 574 |
| 13 |
인생의 선물 같은 순간
| 2018.05.12 | 672 |
| 12 |
빠삐용은 시간을 낭비했다
| 2018.05.12 | 1241 |
| 11 |
매일이 성탄절인 세계
[1] | 2018.05.12 | 631 |
| 10 |
부패관리 해부한 '캄비세스 왕의 재판'
| 2018.05.12 | 1016 |
| 9 |
'여성의 시장'에 투자하라
| 2018.05.03 | 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