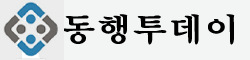부여는 꿈꾸는 도시같다. 백제의 고도여서가 아니다. 부여군 읍내의 소박한 로타리에는 동상이 서 있고 딱 적당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시끄럽지도, 적막하지도 않다. 게다가 백마강이 말없이 들어왔다 흘러 나간다.
부여 시장은 5일장이지만 평일에도 문을 여는 상점들이 꽤 많다. 물론 5일장이야 흥겹기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장이 서지 않는 날, 오후 한복판에 부여 시장을 어슬렁거리는 흥취는 또 남다르다. 기웃거리며, 먹어가며, 잠시나마 다른 세상길을 걸어가기 딱 좋다.
백마강 뱃나루가 시장에서 멀지 않다. 여유만 있다면 얼마든지 걸어서 갈 수 있다. 나루터 주차장 뒤로 야트막한 언덕이 강녘을 내려보고 있다. 소나무로 가리워진 기슭이 집 한채를 품고 있다. 창연한 고택도 아니고 알록달록한 요즘 주택도 아니다. 그저그런 평범한 모습인데 이게 정감을 준다.
정원으로 난 옛 창문을 열어놓고 방 안에 앉으면 초등학교 시절 살던 집의 건넌방이 생각난다. 이집에서는 막국수와 돼지고기 수육을 먹어야 한다. 기꺼이 찾아가 먹을 만하다. 강원이 아닌 충청의 막국수라··· 입맛이야 천차만별이지만 몇번이고 다시 가 막국수를 먹었다. 초겨울에도 먹었다. 그리고 배부른 포만감으로 쌀쌀한 백마강변을 거닐었다.
부여군 양화면에는 송정마을이라는 곳이 있다. 가구래야 채 삼십 집도 안되는 곳에서 지난해 ‘내 인생의 그림책’을 23권이나 출간했다. 서울에서 전시회도 열렸다. 마을 노인들이 각자 한 권씩 쓰고 그린 책들이다. 아득하게 잠겨 있던 기억을 하나하나 건져 내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
이들이 보낸 세월은 모두가 안다. 일제감정기, 해방과 혼란, 한국전쟁, 가난과 핍박, 올림픽과 경제 성장까지, 시절이 압박하는 질고를 온몸으로 고스란히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살만하니 떠날 날이 가까이 온 것이다.
노인들은 어릴 때 된장국 끓여 주던 엄마를 그렸고 철모르고 뛰어 다니던 아이를 그렸다. 청춘이 터져 나갈 듯한 젊은이의 숨은 포부를 기억하고 피와 땀으로 키워 낸 아이들을 그리워했다. 서툴고 투박한 글과 그림은, 잊혀지고 파손된 가치와 정감을 살려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펴낸 책들은 그들의 인생이 흘러가듯 참 많은 것들이 사라졌다고 말해 준다.
시골 노인들이 책을 낸 힘이 있다. 작은 마을에 세우진 ‘송정야학당’이다. 선생님을 따라 글을 읽는 아이들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지만 마을 길 옆 야학당 건물과 간판은 빛이 바랜 데로 남아 있다. 마을 사람들이 손을 모아 지은 흙집에 이제는 슬레이트가 얹혀져 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어 수업을 금지시킬 때 야학당은 어린이들에게 한글과 역사를 가르쳤다. 지난 1960년대까지 문을 열어 온 야학당 덕분에 송정마을에는 글을 못 배운 아이들이 없었다.
지금 그림책을 낸 마을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지력의 밑바당에 야학당이 있다. 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말에는 조리가 있고 단어가 다양했고 발음이 정확했다. 송정마을에는 이들이 운영하는 북카페도 마련돼 있다. 시골이라고, 노인이라고, 책을 멀리하며 말을 어눌하게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인생에 어떤 씨앗이 심어졌는지 그게 중요하다. 1920년대 농촌의 모양이 어떠했는지는 짐작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어떤 선각자는 작은 마을에 배움의 씨앗을 뿌렸고 땀으로 키워냈다. 씨앗은 흙에 묻혔지만 생명을 지키며 영글다가 삶의 말미에서 감동의 꽃을 피운 것이다.
남의 장례식에 갔다가 울컥하는 경우가 있다. 생전에는 본 적도 없고 이별이 슬플 일도 없는데 눈물이 나는 것은 망자가 살아 온 인생의 열매 덕분이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되는 무대에서 열매가 터지면서 남은 자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복 된 죽음이고, 부러운 결말이다.
유정옥 권사의 장례예배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장의사에서 진행됐다. 며느리는 조가를 부르고 가족 대표로 손자가 나와 외할머니를 회상했다. 손자는 한국어와 영어로 할머니 이야기를 하다가 몇 번이고 흐느끼며 울었다. 번듯한 은행의 부행장으로 성장한 손자는 할머니가 얼마나 올곧고 바르게 살았는 가를 말했다.
“할머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어요. 돈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제 강점기에 평안도 만석꾼의 딸이던 그녀는 경성대학교를 졸업했다. 식민지의 유일한 4년제 대학교에 돈이 많다고 입학 할 수는 없었다. 아무리 부자집이라도 여자는 기껏 중등과정 교육을 받기도 힘든 때에 대단히 희소한 일이다. 똑똑하기로 치면 얼마든지 위세를 떨만한 처지였다.
유 권사는 나름 전설을 만든 사람이다. 남편이 일본 유학 중에 징병으로 일본군에 강제 입대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거금을 현찰로 마련해 베낭에 가득 채우고 직접 현해탄을 건넜다. 부대 앞 여관에 진을 치고 일본군 지휘관들에게 선을 댔다. 그리고 가짜 폐병 진단서를 마련해 남편을 의가사 제대시켜 고향으로 데리고 왔다.
“왜놈들 전쟁에 내 남편을 죽일 수는 없었다. 두려움은 이겨 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다.” 자손들에게 남긴 그녀의 간증이다.
장로가 된 맏사위도 그녀 때문에 교회에 가게 됐다. 청파아파트에서 건너편 동에 마주보며 살던 장모와 사위는 새벽마다 현관 앞에서 만나 나란히 교회로 향했다.
“45년 동안 단 한 번도 장모님이 화를 내거나, 누구를 나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찬송가를 좀 크게 부르시면 그날은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하고 생각할 정도였지요.” 장모와 사위는 이민길에도 떨어지지 않고 한평생을 곁에서 지냈다.
유 권사는 아침과 저녁 100번씩 “감사합니다”를 외웠다. 그녀는 95세가 되도록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입원한 적도 없었다. 심지어 독감 주사도 맞지 않고 건강진단도 받지 않았다. 주치의가 “나중에 병원에 가려면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설득할 정도였다.
“어머니에게는 주사 자국 하나 없어요. 그저 주어진 수명을 다하시고 힘이 소진해서 돌아가신 거지요.” 거친 인생의 풍파가 그녀에게도 어김없이 닥쳤지만 유 권사의 인생 여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죽음도 평온했다.
유 권사는 환갑부터 칠순, 팔순 등 일체의 잔치를 거부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됐다”고만 말했다. 후손들은 장례예배가 끝난 뒤 “못해 드린 잔치 비용으로 장례 잔치를 열었다”며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조문객들을 대접했다.
씨앗의 성공은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의 성공은 품고 있는 씨앗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새로운 씨앗들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정의로우면 그 씨앗을 잉태한 열매가 존경을 모으고 인정을 받는다.
품격 높은 죽음은 이전에 살아 온 여정의 연장선이다. 그 길은 사후에도 이어진다. 오늘의 삶이 내 마지막 순간과 후손의 인생으로 이어지고 영원한 생명까지 판가름한다.
Comment 0
| No. | Subject | Date | Views |
|---|---|---|---|
| 28 |
코로나가 '박수근 빨래터'로 내몰다
| 2020.06.04 | 3451 |
| 27 |
토론토의 교훈 "쉽게 돌아서지 말라"
| 2020.02.27 | 2756 |
| 26 |
부산 검도 후계자, 피지軍 장교, 미군 교관...그가 일군 빛나는 인생 여정
| 2019.07.03 | 1513 |
| 25 |
군산 터널 끝에서 만나는 윤동주
| 2019.06.14 | 18098 |
| 24 |
'추락하는 인생' 해장국에게 배운다
[2] | 2019.03.20 | 1593 |
| 23 |
비밀의 씨앗 ‘게이쿄’ & 도쿄 '다방'
| 2018.10.30 | 13087 |
| 22 |
비 속의 파리, 시애틀, 한밤중 시나이 반도 그리고 다시 서울
| 2018.05.30 | 1013 |
| » |
LA 장례식, 부여 야학당
| 2018.05.14 | 1044 |
| 20 |
인생의 지혜 물으니 "그때 꾹 참고 넘기길 잘했다"
| 2018.05.14 | 853 |
| 19 |
돈은 없고...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2018.05.14 | 848 |
| 18 |
잃어버린 나의 등대를 찾아서...
| 2018.05.14 | 1253 |
| 17 |
포기해야 할 순간들...그래야 산다
| 2018.05.14 | 964 |
| 16 |
오! 솔레미요~~샌타바바라
| 2018.05.14 | 686 |
| 15 |
이별은 끝이 아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 2018.05.12 | 1006 |
| 14 |
샌타바바라의 젊은 영혼들
| 2018.05.12 | 574 |
| 13 |
인생의 선물 같은 순간
| 2018.05.12 | 672 |
| 12 |
빠삐용은 시간을 낭비했다
| 2018.05.12 | 1241 |
| 11 |
매일이 성탄절인 세계
[1] | 2018.05.12 | 631 |
| 10 |
부패관리 해부한 '캄비세스 왕의 재판'
| 2018.05.12 | 1016 |
| 9 |
'여성의 시장'에 투자하라
| 2018.05.03 | 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