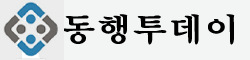TV세트를 부수는 퍼포먼스나 독특하다 못해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예술 행보의 흔적은 그자리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젊은 기자에게 조금도 권위나 교만을 부리지 않았다. 지극히 겸손하고 예의를 깍듯이 지켰다.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대화를 나눈다는 설렘이 더욱 증폭됐다. 기자로서 의례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기억도 나지 않는다.
다만 뚜렷이 귓가에 남아 있는 그의 말이 있다. "하...돈이 문제에요. 돈이 더 있어야 하는데…" 작품을 만드는데 늘 돈이 모자랐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건 체면 치레를 안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처음 만나는 기자에게 소위 예술을 한다는 사람이 '돈 걱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가. 게다가 은행장이나 기업 회장 앞에서 하는 말도 아니지 않는가.
정말 그릇이 다른 사람이었다. 순수와 무구가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한없는 부러움과 충격으로 다가왔다.
오래 전인 1986년 한국의 한 언론이 백 선생을 인터뷰했을 때 이런 대화가 오간 적이 있다.
"왜 조국을 놔두고 외국에서만 예술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보면 곰팡이 냄새를 넘어서 기가 막히는 질문이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아쉬움이 통하는 시대였다.
백남준 선생의 대답은 이랬다. "상품만 수출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도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야 좋은 겁니다. 나는 세계를 떠돌며 문화를 수출하는 문화 상인이에요."
미국에서 대만계 미국인 청년 제레미 린이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한 적이 있다. 미국 프로농구 뉴욕 닉스팀 선수인 린은 그야말로 '스포츠계의 신데렐라'였다.
뉴욕타임스(NYT)가 스포츠 섹션은 물론 메인 섹션 1면과 심지어 비즈니스면까지 하루에 세 군데서 그의 기사를 대서특필할 정도였다.
아시아계 남자는 야들야들하고 부끄러움 잘 타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판에 몸과 몸이 거칠게 부딪히는 프로 농구 경기에서 린이 연일 승전보를 올리면서 인종에 대한 의식까지 바뀔 정도였다.
여기에 하버드대학교 출신이란 점과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편견 때문에 프로팀 입단조차 거부당했던 과거사까지 겹치면서 그의 스토리는 '린세너티(린 광기)'란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그러자 "왜 우리는 린 같이 세계 정상급 프로 농구 선수가 없느냐"는 시기어린 투정이 터져나왔다. 뭐든 잘해야 하고, 내가 이겨야 속이 풀리는 한국인의 오기가 발동된 것이다.
바로 그런 때 한국계 미국 청년이 린을 버금가는 인기 스타로 탄생할 뻔 했다. 미국 TV에서 가장 시청율이 높은 프로그램의 하나가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노래경연 대회다. 평균 3000만명이 시청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일년에 한 명을 뽑아 10명의 스타가 출현했다. 대부분 유명 가수가 돼 그래미상, 아메리칸 뮤직상, 빌보드 뮤직상 등을 휩쓸었다.
그런데 22세의 한인 청년 한희준이 최종 결승전에 올랐던 것이다. 미국 언론은 그를 '아메리칸 아이돌의 제레미 린'이라고 불렀다. 한희준은 부드러운 음색이 매력적이다. 심사위원인 음반제작자 랜디 잭슨은 '매우 인상적이며 충격을 받았다"고 경탄했다. 제니퍼 로페즈는 "비단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라고 극찬했다.
아메리칸 아이돌 결승 무대에 선 자체만도 대단한 사건이다. 더구나 아시아계 스타 가수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미국 시장에서 한의준은 그야말로 할 바를 다 했다. 아깝게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백남준 선생의 후예가 팝의 본고장에서 최고의 무대를 흔든 것이다.
앞으로 한류의 번식은 예측을 불허할 만큼 빠르고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전혀 예상도 못한 구석에서 '대박'이 터질 수도 있다. 싸이가 어느날 유투브를 타고 글로벌 스타가 될 줄 누가 알았는가.
문화의 힘은 21세기에 돈이나 무기보다 강하다. 무력으로 남의 땅을 뺏기는 힘들어도 문화 식민지로 삼으면 그만이다. 문화 강국이 되면 선진국이다.
그런데 문화는 거창한 예술 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아주 평범한 시민 한 명의 수준이 문화를 결정짓는다.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쩡쩡 울리는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 중에는 버젓한 젊은 회사원들도 부지기수다. 뉴욕이나 파리, 도쿄에서는 시내 한복판에서 등산복에 등산화까지 신은 한국인 관광객을 쉽게 볼 수 있다.
어쩌다 한 번 불연듯 튀어 나와 '한 건'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진심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문화를 쌓아야 한다. 문화력이 민족의 힘이다. 그건 한 개인의 시민의식과 에티켓 그리고 예술에 대한 관심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커질 수 있다.
Comment 0
| No. | Subject | Date | Views |
|---|---|---|---|
| 28 |
코로나가 '박수근 빨래터'로 내몰다
| 2020.06.04 | 3404 |
| 27 |
토론토의 교훈 "쉽게 돌아서지 말라"
| 2020.02.27 | 2722 |
| 26 |
부산 검도 후계자, 피지軍 장교, 미군 교관...그가 일군 빛나는 인생 여정
| 2019.07.03 | 1468 |
| 25 |
군산 터널 끝에서 만나는 윤동주
| 2019.06.14 | 18063 |
| 24 |
'추락하는 인생' 해장국에게 배운다
[2] | 2019.03.20 | 1563 |
| 23 |
비밀의 씨앗 ‘게이쿄’ & 도쿄 '다방'
| 2018.10.30 | 13035 |
| 22 |
비 속의 파리, 시애틀, 한밤중 시나이 반도 그리고 다시 서울
| 2018.05.30 | 996 |
| 21 |
LA 장례식, 부여 야학당
| 2018.05.14 | 1026 |
| 20 |
인생의 지혜 물으니 "그때 꾹 참고 넘기길 잘했다"
| 2018.05.14 | 839 |
| 19 |
돈은 없고...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2018.05.14 | 835 |
| 18 |
잃어버린 나의 등대를 찾아서...
| 2018.05.14 | 1240 |
| 17 |
포기해야 할 순간들...그래야 산다
| 2018.05.14 | 948 |
| 16 |
오! 솔레미요~~샌타바바라
| 2018.05.14 | 666 |
| 15 |
이별은 끝이 아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 2018.05.12 | 992 |
| 14 |
샌타바바라의 젊은 영혼들
| 2018.05.12 | 560 |
| 13 |
인생의 선물 같은 순간
| 2018.05.12 | 650 |
| 12 |
빠삐용은 시간을 낭비했다
| 2018.05.12 | 1219 |
| 11 |
매일이 성탄절인 세계
[1] | 2018.05.12 | 620 |
| 10 |
부패관리 해부한 '캄비세스 왕의 재판'
| 2018.05.12 | 974 |
| 9 |
'여성의 시장'에 투자하라
| 2018.05.03 | 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