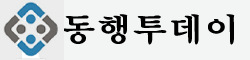주택 가격이 경기 순환 과정에 미치는 역할을 살펴 보자면 근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발견한다. 불황을 염려하는 비관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경제 상황은 과거보다 더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9일 비즈니스 칼럼을 통해 미국 경제는 올해 불경기로 접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설혹 불황이 시작된다고 해도 주택 가격 하락이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번 금융위기로 인한 불경기에서 벗어날 때도 집값 회복은 나중에 이뤄졌기 때문에 경기하락을 집값이 선도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UCLA 경제학과 에드워드 리머 교수는 “주택 시장은 현재 경기 하락을 주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물론 주택 가격이 앞으로 경기 회복을 얼마나 뒷받침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판매와 가격은 모두 상승세가 꺽였다. 하지만 주택 건축 상황은 젊은 세대의 수요와 맞물려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안정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제 상황과 관련해 집값에 관심이 집중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몇 가지 그럴만한 원인들이 있다.
지난 번 금융위기로 인한 불경기에서 벗어날 때도 집값 회복은 나중에 이뤄졌기 때문에 경기하락을 집값이 선도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UCLA 경제학과 에드워드 리머 교수는 “주택 시장은 현재 경기 하락을 주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물론 주택 가격이 앞으로 경기 회복을 얼마나 뒷받침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판매와 가격은 모두 상승세가 꺽였다. 하지만 주택 건축 상황은 젊은 세대의 수요와 맞물려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안정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제 상황과 관련해 집값에 관심이 집중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몇 가지 그럴만한 원인들이 있다.
주택 시장은 유동성이 크다
집값 동향이 경제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경기에 주택 가격이 끼치는 파급 효과는 지대한 게 사실이다.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환 폭도 다른 경제 요소보다 크기 때문이다. 향후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갈 지를 보려면 주택 시장을 살펴 봐야 한다. 다른 경제 요소들과는 달리 변동 폭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불경기 시즌에 주택 시장이 경제 전반에 걸쳐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이며 경기가 좋을 때는 약 2배로 증가한다. 다른 경제적 요소들의 비중이 훨씬 크다. 그러나 다른 요소는 집값 만큼 그렇게 크게 올랐다 내렸다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정부 지출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20%를 차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경기 동향에 따른 변화의 차이는 3%포인트 정도에 불과하다. 경제적 무게에 비해 변동성이 아주 작은 것이다. 그러나 주택 시장이 날리는 펀치의 파괴력은 무게에 비해 훨씬 크다.
결론적으로 주택 시장이 차지하는 경제 규모는 호황과 불황 사이 전체를 놓고 계산해도 7% 이상을 절대 넘지 않는다. 그러나 UCLA 리머 교수가 지난 2007년 발표한 저서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불경기로 경제가 약화됐을 때 주택 시장의 영향력은 평균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시장 다음으로는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소비 지출이 뒤를 잇는다. 그러나 이조차 주택 가격의 변동과 긴밀하게 연동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집을 구입할 때 가구나 가전제품을 새로 바꾸거나 자동차를 사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집값 동향이 경제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경기에 주택 가격이 끼치는 파급 효과는 지대한 게 사실이다.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환 폭도 다른 경제 요소보다 크기 때문이다. 향후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갈 지를 보려면 주택 시장을 살펴 봐야 한다. 다른 경제 요소들과는 달리 변동 폭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불경기 시즌에 주택 시장이 경제 전반에 걸쳐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이며 경기가 좋을 때는 약 2배로 증가한다. 다른 경제적 요소들의 비중이 훨씬 크다. 그러나 다른 요소는 집값 만큼 그렇게 크게 올랐다 내렸다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정부 지출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20%를 차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경기 동향에 따른 변화의 차이는 3%포인트 정도에 불과하다. 경제적 무게에 비해 변동성이 아주 작은 것이다. 그러나 주택 시장이 날리는 펀치의 파괴력은 무게에 비해 훨씬 크다.
결론적으로 주택 시장이 차지하는 경제 규모는 호황과 불황 사이 전체를 놓고 계산해도 7% 이상을 절대 넘지 않는다. 그러나 UCLA 리머 교수가 지난 2007년 발표한 저서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불경기로 경제가 약화됐을 때 주택 시장의 영향력은 평균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시장 다음으로는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소비 지출이 뒤를 잇는다. 그러나 이조차 주택 가격의 변동과 긴밀하게 연동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집을 구입할 때 가구나 가전제품을 새로 바꾸거나 자동차를 사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주택 시장은 이번 경기 하락세를 이끌지 않고 있다
전통적으로 집값 동향은 국내총생산(GDP) 분기별 변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 왔다.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이다. 그 만큼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지표를 분석해 보면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거보다 집값 변동이 끼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55년 들이닥친 불경기는 한국전쟁 이후 정부가 지출을 대폭 감소한 이유가 결정적이었다. 2001년 불황 역시 닷컴 거품의 붕괴로 기업의 지출이 급락한 게 중요한 원인이었다. 주택 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이들 두 번의 불경기는 다행히 살짝 지나갔다.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깊은 내상을 남기지 않고 회복됐다. 2001년 불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경미한 수준이었다. 그 배경에 주택 시장이 있다.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의 불경기는 주택 시장의 영향이 크게 부각된 케이스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산하 세인트루이스 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경기 침체에서 건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1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또 건설회사의 직원 해고, 관련 업계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실업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면 현재 주택 시장은 어떤가. 한마디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혼재돼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소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혼재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집값 동향은 국내총생산(GDP) 분기별 변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 왔다.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이다. 그 만큼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지표를 분석해 보면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거보다 집값 변동이 끼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55년 들이닥친 불경기는 한국전쟁 이후 정부가 지출을 대폭 감소한 이유가 결정적이었다. 2001년 불황 역시 닷컴 거품의 붕괴로 기업의 지출이 급락한 게 중요한 원인이었다. 주택 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이들 두 번의 불경기는 다행히 살짝 지나갔다.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깊은 내상을 남기지 않고 회복됐다. 2001년 불황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경미한 수준이었다. 그 배경에 주택 시장이 있다.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의 불경기는 주택 시장의 영향이 크게 부각된 케이스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산하 세인트루이스 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경기 침체에서 건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1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또 건설회사의 직원 해고, 관련 업계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실업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면 현재 주택 시장은 어떤가. 한마디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혼재돼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소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혼재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바이어들은 가격에 실망하고 있다
판매 상황과 가격을 살펴 보면 주택 시장은 지금 노랑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전국부동산협회에 따르면 기존 주택의 판매는 지난 12월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0% 하락했다. 원인에 대한 지적은 다양하다. 금리 인상과 너무 치솟은 집값을 탓하는 사람도 있고 주택 공급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다. 비록 고용 시장이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버는 돈보다 주택 가격이 훨씬 빠르게 급등했다는 점이다. 집값이 지금까지 너무 빨리 오르는 바람에, 사전에 예측해 놓은 바이어 구매력까지 훨씬 넘어 버린 것이다.
질로우(Zillow)에 따르면 2012년 이래 주택 가격은 50% 정도나 오른 상태다. 많은 주택 시장들이 일찌감치 바이어의 구매 가능한 수준을 뛰어 넘어 버렸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경우, 집값이 2012년 이후 두 배나 급등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는 90%까지, 조지아주 애틀랜타도 84%, 테네시주 내시빌이 78%, 텍사스주 댈러스도 76%까지 집값이 치솟았다. 텍사스에서 집을 살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디서 사야 하는가.
그래도 집값은 오래도록 시장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가격 하락은 물론 확산될 것이다. 건축회사들은 인력 감축 카드를 내밀고 있다. 존번스 부동산컨설팅회사 창업주인 존 번스는 “일년 전에는 시장 예측이 성장 지속과 하락으로 갈라졌다”면서 “지금은 모두 조심스럽게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언뜻 이런 이야기는 나쁜 소식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집을 팔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겉으보 보이는 만큼 나쁜 뉴스도 아니다.
판매 상황과 가격을 살펴 보면 주택 시장은 지금 노랑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전국부동산협회에 따르면 기존 주택의 판매는 지난 12월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0% 하락했다. 원인에 대한 지적은 다양하다. 금리 인상과 너무 치솟은 집값을 탓하는 사람도 있고 주택 공급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다. 비록 고용 시장이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버는 돈보다 주택 가격이 훨씬 빠르게 급등했다는 점이다. 집값이 지금까지 너무 빨리 오르는 바람에, 사전에 예측해 놓은 바이어 구매력까지 훨씬 넘어 버린 것이다.
질로우(Zillow)에 따르면 2012년 이래 주택 가격은 50% 정도나 오른 상태다. 많은 주택 시장들이 일찌감치 바이어의 구매 가능한 수준을 뛰어 넘어 버렸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경우, 집값이 2012년 이후 두 배나 급등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는 90%까지, 조지아주 애틀랜타도 84%, 테네시주 내시빌이 78%, 텍사스주 댈러스도 76%까지 집값이 치솟았다. 텍사스에서 집을 살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디서 사야 하는가.
그래도 집값은 오래도록 시장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가격 하락은 물론 확산될 것이다. 건축회사들은 인력 감축 카드를 내밀고 있다. 존번스 부동산컨설팅회사 창업주인 존 번스는 “일년 전에는 시장 예측이 성장 지속과 하락으로 갈라졌다”면서 “지금은 모두 조심스럽게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언뜻 이런 이야기는 나쁜 소식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집을 팔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겉으보 보이는 만큼 나쁜 뉴스도 아니다.
건설업자들은 별로 화를 내지 않고 있다.
주택 판매와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주택 건축회사들은 별로 요동하지 않고 있다. 성장과 하락의 경계선상에서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중 건설된 주택은 120만 채로 과거 불경기 때의 50만 채보다 두 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1990년 폭발세를 보이던 당시 기록한 150만 채보다는 낮다.
건축업자들은 일자리가 많은 인구 밀집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지방정부의 각종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 실업율이 떨어지면서 직원 임금이 올라 일손을 구하는데 힘이 들다고 불평하고 있다. 결국 사람들이 살기 싶어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메시지다.
주택시장은 지난 3분기 GDP 대비 비중의 3.9%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내내 경기 하강 곡선에 일조하고 있다. 주택 시장은 이미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이야기다. 조만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악화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다.
주택 판매와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주택 건축회사들은 별로 요동하지 않고 있다. 성장과 하락의 경계선상에서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중 건설된 주택은 120만 채로 과거 불경기 때의 50만 채보다 두 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1990년 폭발세를 보이던 당시 기록한 150만 채보다는 낮다.
건축업자들은 일자리가 많은 인구 밀집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지방정부의 각종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 실업율이 떨어지면서 직원 임금이 올라 일손을 구하는데 힘이 들다고 불평하고 있다. 결국 사람들이 살기 싶어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메시지다.
주택시장은 지난 3분기 GDP 대비 비중의 3.9%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내내 경기 하강 곡선에 일조하고 있다. 주택 시장은 이미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이야기다. 조만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악화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다.
미주한국일보 유정원 기자
<사진설명>
The New York Times
<사진설명>
The New York Times
Comment 0
| No. | Subject | Author | Date | Views |
|---|---|---|---|---|
| 25 |
대학까지 보냈는데...얹혀사는 부메랑 세대
| host | 2019.12.13 | 1808 |
| 24 |
'장수시대' 은퇴 계획, 뜻대로 안 되는 이유
| host | 2019.12.13 | 1138 |
| 23 |
노후 대비 비상..시니어케어 비용 상승
| host | 2019.07.19 | 3146 |
| 22 |
'은퇴'도 때가 중요 '언제'가 좋은가
| host | 2019.07.19 | 1137 |
| 21 |
나이 듦 인정할수록 치매 감소
| host | 2019.07.19 | 10024 |
| 20 |
주택 매매도 전부 인터넷으로
| host | 2019.07.03 | 1539 |
| 19 |
최저임금의 '정체' 알아야 산다
| host | 2019.07.03 | 454 |
| 18 |
"소매업이 죽는다" 파산 행렬
| host | 2019.06.13 | 597 |
| 17 |
내 사회보장연금 미리 챙겨야 한다
| host | 2019.06.13 | 431 |
| 16 |
'직원이 상전' 일손 부족 비명
| host | 2019.06.13 | 413 |
| 15 |
젊은부부 내집 마련 '하늘의 별따기'
| host | 2019.06.13 | 582 |
| 14 |
불황의 파도가 다가온다
| host | 2019.06.13 | 964 |
| 13 |
자녀 돈 교육, 시대에 맞게 해라
| host | 2019.06.13 | 518 |
| 12 |
‘30대 자녀’ 부모가 도와야 산다
| host | 2019.03.28 | 431 |
| 11 |
사모펀드 대박? 장기투자 각오하라
| host | 2019.03.28 | 941 |
| 10 |
타지 않고 모신다 ‘초고가 자동차 콜렉션’
[1] | host | 2019.03.15 | 476 |
| 9 |
피카소, 르네…거실 안에 1억달러 ‘가득’
| host | 2019.03.15 | 1031 |
| 8 |
야구카드 한장에 280만달러 투자
| host | 2019.03.15 | 771 |
| 7 |
작은 도시서 큰 아이 “돈 더 번다”
| host | 2019.03.15 | 385 |
| 6 |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택스리턴 늦을수도
| host | 2019.03.15 | 14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