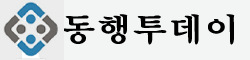프랭크 킨슬러 선교사는 임종을 앞두고도 병상을 지키는 한국인 며느리에게 농담을 던졌다.
"소변 대변 받아줘 고맙시다. 그 만큼 했으면 됐시요."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도 사투리는 영혼의 모국어로 그의 입술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권세열'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바쳐진 그의 인생은 3대째 한반도 땅에 복음의 꽃으로 이어지고 있다.
1928년 약관 스물 네 살의 청년으로 식민 통치에 신음하던 한국인을 찾아 온 후 여든 여덟 살의 나이로 1992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프랭크 킨슬러 선교사는 권세열 목사의 삶을 살았다.
그는 약혼녀를 불러들여 선교지 평양에서 결혼했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성경구락부'를 만들어 길거리를 헤매는 어린 거지들을 돌보고 가르쳤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던 그를 평양 역전에서 일본 경찰들이 짐을 뒤지고 때린 일은 오히려 이를 지켜 본 한국인 사이에 감동과 단결의 힘을 낳았다.
신사 참배를 끝내 거부하고 일본 제국주의 압력으로 선교지를 떠난 그는 광복 이후 온 가족을 데리고 돌아와 새로 태어난 한국 땅에서 봉사와 전도를 재개했다.
전쟁의 불길도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을 향한 그의 열정을 이기지 못했다. 대천 해수욕장에서 선교사 모임을 갖다가 한국전쟁 발발의 소식을 접한 프랭크 킨슬러 선교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잔류한 몇몇 선교사 가운데 한 명이었다.
전쟁 이후 변변한 교육기관이 절대 부족하던 시절 그가 전국 방방곡곡에 세운 성경구락부는 가난한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고 복음을 접한 구원의 집이었다.
이민교회에 미친 손길도 크다. 67세에 은퇴해 미국으로 돌아 온 프랭크 킨슬러 선교사는 나성영락교회 한빛교회 등을 영어 사역자로 섬기며 한인교회 부흥을 도왔다.
평양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 아더 킨슬러 역시 미국장로교(PCUSA) 선교사로 평생을 한국에서 보내는 것은 대를 이은 순종의 모범이다. 지난해 칠순을 맞은 그의 한국 이름은 권오덕.
한국교회 영어 목회의 원조로 서울의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할렐루야교회를 섬기고 지금도 서울교회에서 영어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동두천 유흥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한 이래 경제발전으로 새로 세워지는 공단마다 아더 목사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아더 목사는 한국 여인과 결혼했다. 신영순 사모와 함께 함양 여천 광양 순천 공단 등을 돌며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농어촌 교회를 지원했다. 산업선교를 용공으로 몰아 부치던 시절에도 그의 순수한 헌신을 정부조차 인정했을 정도였다.
신영순 사모는 시가의 신앙 전통을 이어 장애인 사역을 벌이고 지금은 북한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콩우유 공장 두 곳과 빵 공장 두 군데 고아들을 키우는 육아원 한 곳을 지원하고 있다.
아더 목사의 후원을 받으며 신 사모는 두달마다 북한을 방문해 직접 지원 사역을 챙기고 있다.
북한 관리와 사역을 놓고 논쟁이라도 생기면 그녀가 하는 말이 있다. "내 남편 고향이 어려워서 도와 주려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지면 북측 상대도 머리를 끄덕인다. 한민족을 향한 대를 이은 헌신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더 목사와 신영순 사모가 북한 사역에 힘을 기울이는 이유도 한국인을 향한 사랑 때문이다. "건물이나 공장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가난으로 사람들이 장애가 되고 뒤떨어지게 되면 통일이 되도 치유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회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더 목사 부부의 아들 요한은 이화여대 어학원 영어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3대째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 프랭크 킨슬러 선교사의 여동생 두 명도 오빠를 도와 일제 강점기 한반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 킨슬러 집안에는 사돈을 포함해 무려 17명이 한국 선교사 출신이다.
아버지 프랭크 킨슬러 목사 부부는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안장돼 있다. 아더 목사 부부도 이미 양화진에 누울 터를 마련했다. 옆에는 자식의 무덤 터까지 확보해 놓았다.
킨슬러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으로 떠들지 않았다. 한국인을 위한 헌신을 통해 순종의 신앙을 입증했다. 그리고 흐르는 강물처럼 서둘지 않고 급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대를 이어 묵묵히 선교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일보 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