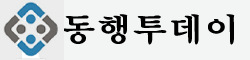걸프 해협에 자리 잡은 아랍에미레이트는 일곱 개 부족이 모여 만든 연방 국가다. 그래도 인접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바다건너 이란 등 다른 아랍 국가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국이다.
그 가운데서도 두바이는 석유도 나지 않는다. 같은 연방 회원국인 아부다비에서 지천으로 뿜어 나오는 원유의 수익금을 원조 받고 있다.
그러나 두바이는 '중동의 라스베이거스'요 '아랍의 홍콩'이다. 율법과 금욕적 생활을 강조하는 아랍권에서 이 도시는 사실상 무엇이든 즐길 수 있는 해방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요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코앞에 있지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술과 유흥을 접할 수 있다.
게다가 원유로 벌어들인 엄청난 자금이 몰리는 아랍의 금융센터다. 세계 원유가의 향방을 좌지우지하는 두바이 원유 선물시장도 이 곳에 열린다.
배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휘두르는 영국의 입김과 연결돼 런던 주식시장과 더불어 어마어마한 자원이 두바이에서 거래된다. 두바이산 금 덩어리는 이집트에서 세 배 값으로 거래될 정도다.
세계에서 유일한 별 일곱 개짜리 호텔도 여기에 있고 삼성건설이 지은 최고층 빌딩도 두바이에 서 있다. 두바이 공항은 중동의 중심지 허브 공항이다.
인구 120만 명중 80%는 돈 벌러 모여든 외국인이다. 인도계 노동자 필리핀 종업원 중국인 노무자들이 엉켜 산다.
요지경 도시 한복판에서 민박을 운영하는 안창수 집사는 29년째 두바이에 살고 있다. 두바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는 지금 본국에 살고 있다. 아들은 병역의무를 수행중이다.
안 집사는 지난 1991년 한민족 축전에 두바이 교민 대표로 14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두바이선 대표가 저 혼자였죠. 이제는 아랍에미레이트에 2500명 정도 한국 사람이 살아요. 기업체 직원들도 저의 집에서 장기 숙박할 정도고요."
안집사의 민박집은 중동 지역 선교사들에겐 말 그대로 오아시스다. 지친 몸을 이끌고 갈 바를 모를 때 그의 '오리엔탈 민박'은 언제나 문이 열려있다.
선교지를 오가는 선교사들이 며칠을 묵어도 지성으로 섬길 뿐 숙박비도 끝끝내 사양하기 일쑤다. 무뚝뚝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지만 속내는 정으로 꽉 차 있다.
"선교사님에게 돈이 어디 있겠어요. 수고하시는데 받으면 안 되죠. 잠자리 드리고 조촐한 밥상 차려 드리는 것뿐이예요. 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새벽 두시 세시에도 선교사를 데리러 공항으로 차를 모는 건 기본이 됐다. 선교사 사모가 아예 그의 민박에서 출산을 한 경우도 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선교사가 한 달씩 쉬고 선교지로 돌아가기도 했다.
"대부분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이 저의 집을 거쳐 가시니까 자연히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다보니 정보도 전하고 물건도 전하면서 중간 연락처가 됐어요."
돼지가 '더러운 짐승'으로 낙인찍힌 이 지역에서 선교사에게 '금싸라기' 돼지고기나 몸이 아파야 먹는 '보약' 라면을 챙겨 인편으로 조달하는 역할도 그의 몫이다.
두바이에는 한인교회 한 곳이 서 있다. 200여 명이 모인다. 아부다비에는 작은 교회 두 군데가 있다.
"홀리 트리니티 처치라는 영국 성공회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세계 각국 100여 교회가 시간별로 예배당을 쓰느라 분주하지요. 그래도 두바이는 선교하기 좋은 곳입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몰려드니까요." 중동지역 어느 곳을 가나 선교사들 사이에 안집사의 명성은 자자하다. 그의 공밥 한 번 먹지 않은 선교사가 없기 때문이다. 안창수 집사는 그 어느 선교사 못지않은 선교를 자신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2006/06/08
아랍에미레이트 = 미주 중앙일보 유정원 기자